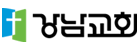(연재) 작은교회, 큰 이야기 - 작은 자들의 찬양이 여울지다 / 안병찬
페이지 정보

본문
난 굳이 ‘여울지다’라는 말 대신 ‘여울치다’라고 말하고 싶다. 문법에 어긋난 말이라거나 혹은 시적 언어라고 한 번 접어둘 필요도 없이 주일 오후마다 작은 자들이 하나 되어 쏟아내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에 관해서는 그렇다. 그들의 찬양은 거친 설렘의 파동이다. 그것은 마치 작은 시냇물이 돌부리를 만나 물결을 일으키듯, 우리 마음의 강물 위에 새로운 떨림을 만들어낸다. 주일의 오후, 그 시간은 다른 어떤 시간보다도 하나님께 향한 순전한 열정이 가장 선명히 드러나는 순간이다.
다음세대만으로 구성된 찬양팀은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다. 코람데오찬양팀,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찬양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담긴 이름이다. 아이들이 예배당 앞에 서는 그 순간, 그들의 마음에 각인된 고백이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그분의 눈동자 앞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다짐이다. 아직은 인생의 출발점에 선 작은 이들이지만, 그들의 찬양은 이미 그 이름을 증언한다.
아이들은 주일 오후 찬양을 위해 모이면 먼저 둥글게 둘러선다. 작은 손들이 서로의 손을 잡고, 하나의 원을 그린다. 그 원은 완벽하게 맞아떨어지지 않는다. 누군가는 조금 안으로 들어오고, 누군가는 바깥으로 삐져나와 있다. 그러나 그 원 안에서 흘러나오는 기도는 완전하다.
한 명이 대표로 기도할 때, 다른 아이들의 눈은 자연스럽게 감기고, 입술은 작은 아멘을 뱉어낸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세요. 우리가 잘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하나님만 기뻐해 주세요.” 그 기도는 길지 않다. 그러나 그 짧은 고백 속에 모든 것이 담겨 있다. 하나님 앞에서의 떨림,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을 향한 의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마음. 손을 잡은 작은 손가락 사이로 땀이 배어 나오고, 아이들의 숨결이 원 안에서 하나로 섞인다. 그 순간은 이미 찬양이다. 노래가 시작되기 전, 기도가 먼저 울려 퍼진다.
리더 양희수가 마이크를 잡을 때, 그 손은 미세하게 떨리지만 마음은 오히려 단단히 굳어져 있다. 목소리는 맑고 투명하다. 음 하나하나에 힘을 억지로 실지 않아도, 그 목소리는 이미 회중의 마음을 충분히 흔들어 놓는다. 강단 앞에 서서 하나님께 자신의 찬양을 올려드린다는 사실만으로도 그 자체가 설득력 있는 메시지가 된다. 희수의 시선은 회중을 넘어, 더 멀리리 향한다. 부르는 첫 음절은 늘 조심스럽게 시작되지만, 다른 보컬들의 목소리가 합쳐지고, 회중의 숨결이 덧입혀져 한 곡의 찬양이 완성된다.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신앙의 고백이 울려 퍼진다.

문가온은 코람데오찬양팀에서 피아노를 연주한 지 어느덧 1년이 되어간다. 언제나 자신감이 있었다. 부끄러움 때문에, 혹은 잘하지 못한다는 자책 때문에 물러서지 않았다. 피아노 앞에 앉은 가온이의 모습은 또래보다 훨씬 어른스럽다. 건반 위를 오가는 손끝은 때때로 흔들리지만, 언제나 동생들을 격려하며 스스로의 사역에 무게감을 더한다. 건반을 두드릴 때마다 가온이의 눈은 악보와 건반, 그리고 하늘을 오간다. 마치 음 하나하나를 하나님께 확인받는 듯하다. 그 순간 피아노는 단순한 악기가 아니라 기도의 통로가 된다. 그 기도는 곡의 흐름 속에서 회중의 마음을 감싸며, 눈에 보이지 않는 은혜의 강을 흘려보낸다.
드럼 앞에 앉은 이정민은 늘 여유로운 얼굴이다. 양손에 잡은 스틱이 어느덧 익숙해 보이고, 멋지다. 드럼의 리듬이 울려 퍼지면 예배당은 다른 공기로 채워진다. 그 소리는 모두의 심장을 두드리는 맥박이 되고, 찬양에 자신을 맡기는 정민이의 얼굴에는 음율이 있다. 스틱을 잡는 시간에는 사춘기 학생의 장난스러움도, 가벼움도 없다. 단지 예배자의 진지함만이 있을 뿐이다.
보컬을 맡은 이민영, 문라온, 김부경, 김경도은 각자 다른 목소리를 가지고 있다. 이민영의 목소리는 확신있고 단단하여 마치 찬양의 기초를 놓는 듯하다. 문라온은 맑고 투명한 음색으로 그 위를 덮는다. 김부경은 여리고 가지런한 음으로 찬양에 은혜를 더하고, 김경도는 성실한 모습과 물러시지 않는 당당함으로 하나의 울림을 완성한다. 서로 다른 음색이 모여 하나의 곡을 부를 때, 그들의 목소리는 교회를 가득 채우는 큰 강물이 된다. 아이들이 부르는 목소리 위로 회중의 목소리가 겹쳐지고, 어른들의 찬양이 배어들어 한순간 예배당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합창단이 된다.
아이들의 찬양은 규격적이지 않다. 때로는 율동으로 함께 하고, 때로는 어색한 순간들도 있다. 그러나 그 어느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충만하다. 어른들은 완벽함을 구한다. 그래서 서로 경쟁하듯 대하고 끊임없이 독려한다. 그러나 코람데오찬양팀의 모습에는 경쟁이 없다. 오직 포용과 사랑이 있을 뿐이다. 오히려 자신들의 부족함마저도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영광이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듯하다.

그 모습을 보며 회중은 깨닫는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완벽을 가장하며 하나님께 나아갔는가. 우리는 얼마나 자주 부족함을 숨기고 형식으로 채웠는가. 그러나 아이들은 부족함을 그대로 드러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간다. 그 진실함이 예배당 전체를 울린다.
주일 오후의 예배당은 늘 다른 공기로 가득 차 있다. 햇살은 창문을 타고 들어와 피아노 건반 위에 반짝인다. 드럼의 심장은 아이들의 긴장된 손끝에서 울려 퍼지고, 보컬의 목소리는 공기 중에 흩어져 모두의 가슴에 스며든다. 그 순간은 단순한 연주가 아니라 성령의 임재다. 눈물이 흐르는 이도 있고, 두 손을 높이 드는 이도 있다. 어떤 이는 조용히 눈을 감고 마음으로만 찬양을 따라 부른다. 그러나 모두가 같은 방향을 바라본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로.
나는 이 시간을 통해 교회의 미래를 본다. 교회의 미래는 화려한 무대나 완벽한 연주가 아니다. 작은 손으로 건반을 두드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노래하며, 서로의 손을 잡고 기도하는 그 모습 속에 있다. 그들의 찬양은 씨앗이다. 오늘은 연약하고 작지만, 내일은 뿌리내려 큰 나무가 되어 공동체를 지탱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방식은 언제나 그렇다. 세상의 강한 것을 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연약한 것을 들어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신다. 그 연약한 목소리와 손끝 속에서 하나님은 교회의 내일을 준비하고 계신다.
찬양이 끝나고 나면 아이들은 늘 환하게 웃는다. 때로는 안도의 웃음이고, 때로는 기쁨의 웃음이다. 그리고 다시 둥글게 모여 손을 잡고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 “하나님, 받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기도는 마치 예배의 마침표 같다. 그러나 동시에 새로운 시작의 쉼표이기도 하다. 그 순간 나는 알게 된다. 코람데오 찬양팀의 찬양은 단지 오늘의 울림이 아니라 내일의 길을 여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을.
-
- 다음글
- 나의 가장 멋진 선배님, 우리 할머니! / 이정현
- 25.12.1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